부식 원인에 대한 규명도 없이 노후 원전이 재가동되는 데 대한 안전성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빛원전 2호기와 한울원전 1호기의 격납건물라이너 플레이트(CLP) 부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너플레이트란 원자로 용기가 들어있는 격납건물의 외벽인 1.2m 두께의 콘크리트 바로 안쪽에 덧댄 약 6㎜ 두께 철판을 의미한다. 즉 방사능이 누설되지 않도록 외벽 안쪽에 추가로 설치한 방호벽 개념이다.
간담회에는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인 한병섭 원자력연전연구소(준) 소장과, 같은 연구소 김성욱 위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배면 부식 관련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식 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 없이 지난 3월 21일과 29일 한빛2호기와 한울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전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격리 방법이 사실상 뚫렸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격리 방법이 부식되고 뚫린 상태에서 원전이 가동돼 왔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고, 격납 건물 건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했으며 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격납 건물 철판부식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스웨덴과 미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해외 사례를 다시금 살펴보고 추정 가능한 여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원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라이너 플레이트의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저하와 관련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 검사시 초음파 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 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며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단기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격납 건물 누설율 시험 주기 연장의 배경으로 제안했던 격납 건물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연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부식 원인에 대한 원안위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병섭 소장은 한빛2호기에서 발생한 첫 부식 현상과 관련해 “원안위는 1983년 건설 당시 고층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건물을 건드리는 사고가 있어서 조처하는 과정에 부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한빛1호기에서도 부식이 확인되자 “두 경우 모두 바다 쪽 방향에서 부식이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소금을 머금은 해풍 때문인 듯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한 소장은 “해외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사례를 분석해보면 라이너플레이트 겉의 콘크리트에 불순물이 있거나, 콘크리트 산성도가 강한 염기에서 다소 중화됐거나 하는 등 콘크리트의 문제로 밝혀졌다”며 “시공 당시 사고나 해풍이 원인이라는 원안위 분석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빛 2호기에서만 부식이 135개 발견되고, 한빛 2호기에서도 50개가 발견됐는데 모두 같은 원인 때문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원안위는 종합적인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원안위는 격납 건물 종합 누설율 시험(ILRT)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돼 재가동 승인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ILRT에서 부식이 발견되지 않다가 육안 검사에서 확인돼 문제가 됐던 것인데, ILRT를 근거로 승인했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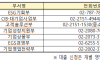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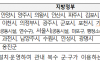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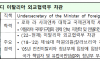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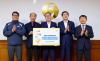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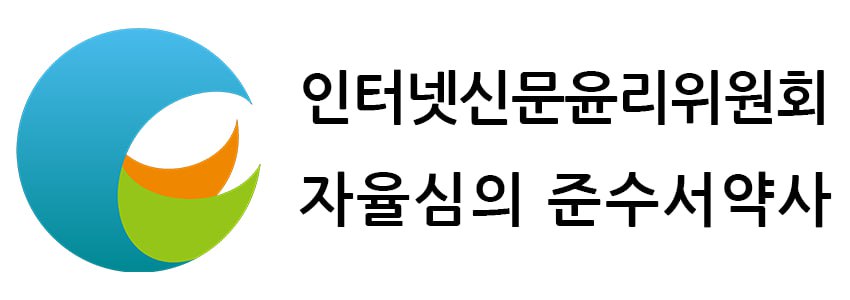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