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장 보러 갈 때마다 느끼는 작지만 중요한 고민이 있다. ‘비닐’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에코 백이나 장바구니를 챙겼다고 해도 막상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봉투나 랩, 비닐 포장재들이 한가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비닐들을 보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매일 비닐은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일까?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과잉 포장’이다. 일부 과일은 낱개로 담겨 있지만 랩으로 감겨 있고, 채소는 비닐봉투에 묶여 있다. 이는 유통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과잉 포장을 줄인다면’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때도 있다는 점이다. 무거운 병 음료를 사면 비닐 손잡이가 따라오고, 빵을 고르면 종이봉투 안에 또 다시 비닐 봉투에 담긴 빵이 있다. 대체 포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마트나 소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고 종이나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리필 스테이션을 도입한 매장도 생기고 있는 추세다. 또한 채소나 과일 등을 낱개로 필요한 만큼만 직접 챙긴 다회 용기 등에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장을 보러 가기 전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작은 목표를 세운다면 환경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고, 기업의 흐름 역시 움직일 수 있다. 기업은 소비자를 끌기도 하지만, 결국 소비자의 니즈를 맞출 수밖에 없다. 즉,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또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이 조성된다면 소비자 역시 자연스럽게 환경을 위하는 길을 걷게 된다.
결국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불편함이 너무 커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점은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를 이어간다는 점이다. 또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왜’ 우리는 비닐을 사용해야만 할까? ‘왜’라는 질문을 이어간다면 정답이 결국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될 수밖에 없다.
사진=픽사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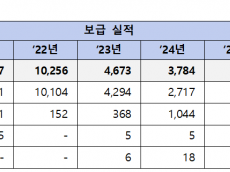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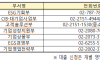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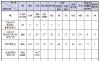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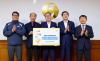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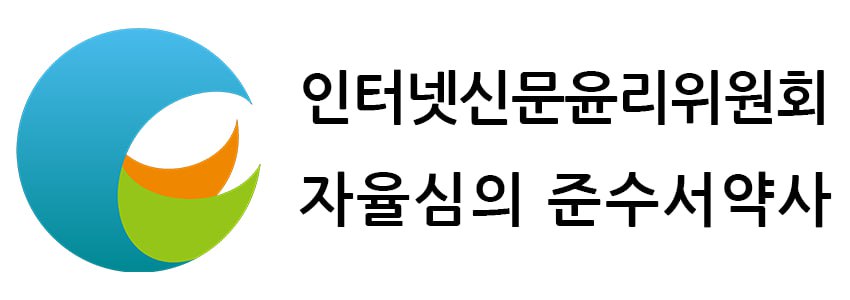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