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최첨단 ICT기술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3조962억원(국고 1조7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정작 가장 중요한 누수 발생을 실시간 감시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수도관 유지관리 등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상수관망과 관련해 누수, 수질 등의 문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ICT기술을 적용, 상수관망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TM)하고, 필요시 원격제어(TC)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적용하고 있는 TM, TC 방식은 20년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관리자가 현장에 출동해 육안으로 확인하는 구식 탐지 방법이다.
김삼화 의원은 “TM, TC방식은 20년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상수도관망을 블록시스템으로 구축한 후 유량계와 수압계을 통해 일정 구간의 유량 및 수압차이를 분석해 누수여부를 추정하는 방법”이라며 “관리자가 현장에 출동해 누수여부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전 근대적인 방법이고 탐지율도 50%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로운 유지관리 시스템은 누수 발생 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도록 해 관망을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산관리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하수관 시스템 구성 및 유지관리 계획에 의하면 GIS정보를 기반으로 하수관망 정보를 구축해 운영이력, 민원정보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게 돼 있다.
시설현황, 위치정보, 개보수 및 준설 등 유지관리 사항 32개 항목은 필수관리 항목으로 하고, 교육이력 등 참고사항 등 17항목은 선택항목으로 구성했다. 유지관리는 시스템 구성요소별 점검 및 유지관리수행방법, 장애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방법은 종이 지도를 전자 지도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하수관망 수명연장과 무관한 전근대적인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신설 하수관로는 파손 또는 누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정확한 위치를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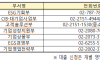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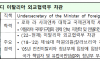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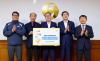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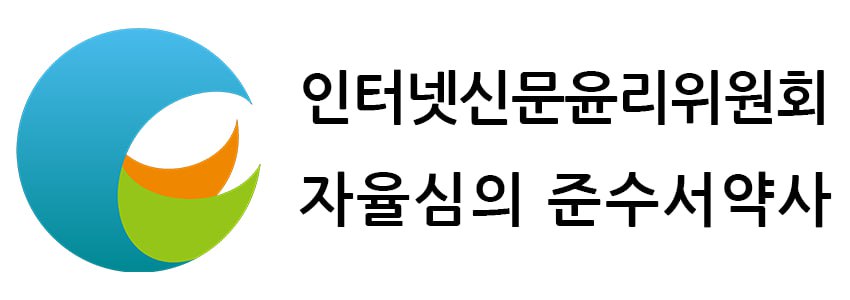
댓글
(0)